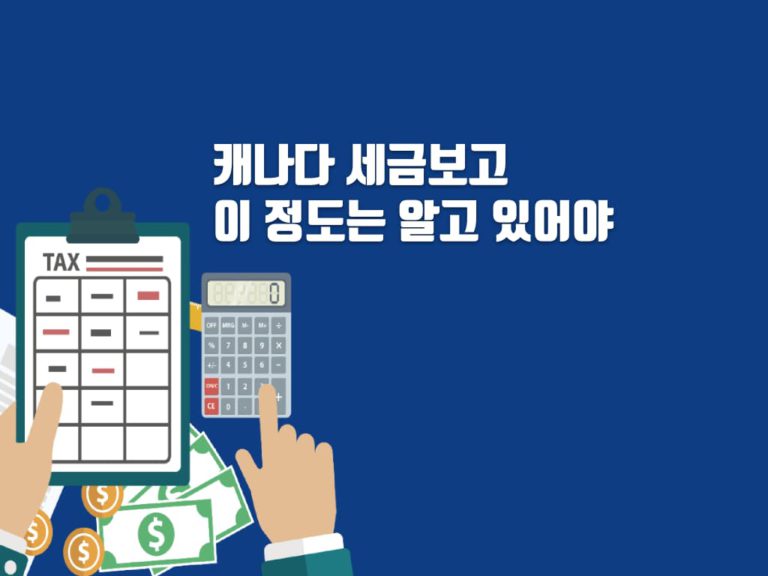북미 최초에 국가를 세운 사람들, 그래서 퍼스트네이션스
1970년대 원주민을 퍼스트네이션스(First Nations)라고 부른 배경에는 국체 회복운동이 있다. 유럽인은 애초부터 원주민을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그들을 국체(國體)가 있는 집단을 보지 않고 부족(band)으로 보았다. 그러나 1970년대 원주민-정부가 토지 사용권 협상이 다시 불거지면서, 원주민은 국체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북미에 최초로 국가를 세운 사람들이란 의미로, 원주민의 미래를 걱정한 장로 솔 샌더슨(Sol Sanderson)이 1972년 원주민자치국연방(Federation of Sovereign Indian Nations 약자 FSIN)에서 퍼스트네이션스 사용을 강하게 주장했다. 부르는 호칭이 달라지면서, 원주민은 국가 대 국가로 캐나다 정부와 토지 사용권에 대한 재협상과 자치권을 강력하게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캐나다인으로 귀속하려는 움직임이 그들의 눈을 띄웠다
1969년 쟝 크레티엥(Jean Chrétien) 인디언부 장관의 백서(White Paper) 사건이 원주민 국체 의식을 깨웠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총리가 되는 크레티엥은 원주민 토지 청구권을 거부하고, 원주민을 별도 집단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백서를 내놓았다.
여기에 대해 해롤드 카디날(Harold Cardinal) 앨버타 원주민 추장은 적서(Red Paper)를 통해 원주민 지위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적서의 원래 제목은 ‘시티즌 플러스(Citizen Plus)’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피에르 트루도(Pierre Trudeau)총리는 ‘정의 사회(Just Society)’를 구현하려면 누구나 캐나다인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봤고, 그 때문에 원주민의 특수한 지위를 없애고자 했다. 결국 1970년에 적서가 나온 후, 트루도는 백서 정책을 포기했다. 이 사건은 원주민 스스로에게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진 계기가 됐고,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퍼스트네이션스였던 셈이다.
자각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았다. 오랜 투쟁의 시작
그러나 한 집단이 스스로를 달리 인식한다고 해서, 그 주변의 인식이 순간에 바뀌는 일은 없다. 원주민은 퍼스트네이션스라는 호칭 만큼 권리를 갖기 위해 오랜 투쟁과 노력에 돌입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랭크 콜더(Frank Calder)재판이다. 니스가 부족 추장인 콜더는 자신과 니스가(Nisga’a)부족의 고유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을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상대로 1969년 제기했다. 연방 고등법원 재판관은 이 재판에서 “조지 3세가 1763년 선언한 왕실 포고문에 따라 원주민의 토지소유권은 존재한다”를 두고 찬성 3대 반대 3으로 갈라졌다. 승소도 패소도 아니었지만, 이 재판을 통해 콜더는 현대 캐나다 법률 상에 원주민의 특수한 지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법관 의견을 통해 공고히 했다. 결국 니스가 부족은 1999년 연방-주정부와 니스가 협정을 통해, 재판을 시작한 지 30년 만인 1999년 자치권을 인정받기에 이른다.